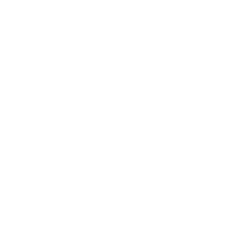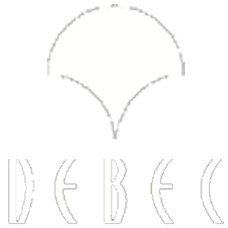“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정신적 상징이자
자연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금강산을 주제로 제작된
유명화가들의 작품 20여점과 아카이브 자료 30여점 한자리에서 전시”
금강산(金剛山)은 한민족 자연미의 결정체이자 민족 정서의 원형,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희망, 그리고 역사와 종교문화의 보고로서 우리 민족의 삶과 정신 속 깊이 자리한 상징적 공간이다. 수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은 금강산을 노래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연에 대한 숭배심, 삶의 위안을 담아내곤 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45년 만인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교류의 상징적 사업으로, 2008년 7월 중단되기 전까지 약 10년간 총 195만 명의 관광객이 북한 금강산을 방문했다. 그러나 현재 금강산은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그리움의 상징’으로 남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대백프라자갤러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전 《금강산에 그리움을 담다》를 오는 7월 1일(화)부터 6일(일)까지 개최한다.
전통적으로 우리 화가들은 금강산을 민족의 상징으로 여기며 숭고미로 표현하거나, 유람의 흥취를 담거나, 전설이 살아 숨쉬는 환상적인 공간으로 묘사하는 등 다양한 시각에서 그려왔다. 변관식, 이상범, 이응로 등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전통회화로의 복귀를 시도하며 금강산 화풍의 맥을 이었다. 유화 작가들 역시 산수를 풍경으로 전환하는 선두 주자로서, 서양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전통 미학과 의미를 담아낸 금강산 작품들을 발표해왔다. 근대기의 금강산과 금강산 그림은 식민지 근대의 사회적 격변 속에서 인종과 문화가 뒤섞이고 자본, 민족, 전통, 근대가 혼재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시기 속에서도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전통의 힘을 버팀목 삼아 혼돈을 이겨낸 작가들은 전통이야말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통로임을 입증했다.
일제강점기 대표 시인 최남선은 1928년 발표한 《금강예찬》에서 금강산을 ‘조선 정신의 표치(標幟)’라 칭하며, 조선인의 강건하고 웅혼한 정신을 금강산의 형상에 비유했다. 금강산 그림의 양적 규모 또한 방대해, ‘금강산 그림만 모아도 미술관 몇 개를 채울 수 있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다. 한국의 수묵화가 중 금강산을 그리지 않은 이는 드물었으며, 금강산은 ‘한국화의 모태’, ‘진경산수의 진원지’라 불리며 미술사적 의의를 지닌다. 20세기 들어 금강산 그림은 관광 상품으로서도 주목받았다. 서양인과 일본인 미술가들이 가세하면서 수채화, 다색판화, 채색화, 유화 등 다양한 매체로 금강산이 표현되기 시작했다. 수채화와 다색판화, 유화는 주로 서양인과 일본인들에 의해 제작되었고, 한국인 화가들은 수묵화를 중심으로 금강산을 그려왔다.
금강산을 방문한 화가들 역시 한국인과 일본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일본 내지의 산과는 다른 금강산의 기암괴석과 준봉 형상은 일본 화가들에게도 큰 조형적 자극을 주어, 《金剛山百態(금강산백태)》, 《金剛山百二十態(금강산백이십태)》 등 다양한 형태의 금강산 연작이 제작되었다. 당시 금강산을 대표적으로 그린 일본 화가로는 가토 쇼린진(加藤松林人), 도쿠다 교쿠료(徳田玉龍), 이와다 슈고우(岩田秀耕) 등을 비롯해 히라후쿠 하쿠세이, 다카시마 홋카이, 야마우치 다몬, 츠지 가코, 하시모토 간세쓰, 고무로 스이운 등 수많은 일본 작가들이 있었다. 양화가로는 이시이 하쿠테이와 다카키 하이스이가 잘 알려져 있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와 조선철도협회 등은 금강산 관광 붐을 조성하기 위해 유명 화가들에게 금강산 사생을 권장하고 전람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금강산 그림의 수요와 유통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서양인과 일본인과 달리, 한국인들에게 금강산과 금강산 그림은 오랜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 유산으로 자리 잡아 왔다.
금강산 사생을 통해 진경산수를 창안한 겸재 정선(謙齋 鄭歚, 1676~1759)으로 부터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에 이어 근대기에는 안중식(安中植, 1861~1919), 조석진(趙錫晉, 1853∼1920), 김규진(金奎鎭, 1868∼1933), 변관식(卞寬植, 1899∼1976), 이상범(李象範, 1897~1972), 노수현(盧壽鉉, 1899∼1978), 이응노(李應魯, 1904~1989), 배렴(裵濂, 1911~1968), 허건(許楗, 1907~1987) 등 시대를 대표하는 수많은 화가들이 금강산을 그려왔다.
이번 《금강산에 그리움을 담다》 전시에서는 1910년대 금강산을 여행하며 제작된 심전 안중식(心田 安中植, 1861~1919)의 〈삼선암〉과 ‘금강산의 화가’로 불리는 소정 변관식(小亭 卞寬植, 1899∼1976)의 〈외금강 삼선암〉, 〈진주담〉 등을 통해 금강산의 힘차고 굳센 화풍을 감상할 수 있다. 변관식은 평생 금강산을 ‘자신을 지켜준 힘의 원천’이라 여겼고,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일생동안 금강산을 그렸다. 청전 이상범(靑田 李象範, 1897~1972)은 1940년경 동아일보를 사직한 후 금강산 기행을 통해 암울했던 마음을 달랬으며, 금강산의 실경을 담아 지역의 아름다움을 남겼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 〈만이천봉 금강산 24승〉은 삼선암, 총석정, 명경대, 유점사 등 금강산의 명소 24곳을 담은 화첩으로, 이상범 특유의 부드러운 화풍이 돋보인다. 화첩을 펼쳤을 때 총 길이 약 7m에 달하는 대작으로 사생풍의 사실적인 묘사와 맑은고 투명한 담채의 효과가 특히 돋보인다. 이 화첩에 수록되어 있는 금강산 4대 사찰중 하나를 그린 ‘유점사’는 근경의 느릅나무에 새잎이 한창 돋아나는 봄 풍경이며, 해금강의 ‘촉석정’은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풍경, 내금강의 ‘명경대’는 노랗게 단풍진 가을풍경으로, 그리고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은 준 덮힌 겨울 영산의 신비한 모습으로 다루어져 있다. 각 경관의 성격과 외형에 맞게 계절감과 구도를 설정하여 풍경의 자연미와 함께 그 운치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으며, 빼어난 사생력을 반영하고 있는 필치와 면적으로 표면 처리된 경쾌한 감각의 선염적인 붓질과 참신한 담채풍은 한폭의 시원한 수채화를 보는 듯하다.
북종화 계통의 화가로서 한국 풍속화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린 이당 김은호(以堂 金殷鎬, 1892~1979)의 〈금강하적〉은 1940년대 제작된 수묵화로, 한국 산천에서 받은 감흥과 미감을 민족미술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월북화가 청계 정종여(靑谿 鄭鍾汝, 1914~84)의 〈보덕굴〉은 사실적 산수화로 금강산의 비경을 담았으며, 박생광의 〈금강산 8폭 병풍〉은 동양화 재료로 서구적 조형방식을 수용한 전위적 시도가 돋보인다.
일본화가 토미오카 텟사이(富岡鉄齊)는 일본의 메이지, 다이쇼시대 문인화가로 일제강점기 금강산을 기행하며 그린 〈금강산도〉를 이번전시회 선보일 예정이다. 1998년 금강산 관광 재개 이후에는 남한의 화가들이 직접 금강산에 올라 절경을 화폭에 담았다. 대표적으로 소산 박대성의 100호 대작 〈삼선암〉과 약 6m 길이의 〈금강산 사계〉는 금강산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송필용, 권용섭의 작품도 함께 선보이며, 북한 화가 최원수의 〈금강산 삼선암〉도 화려한 색채로 삼선암 절경을 담았다. 이 외에도 취봉 이종원, 추강 이형섭의 작품과 민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금강산 풍경 엽서 30여 종, 관광 안내도, 현대아산이 제작한 금강산관광 안내 책자 등 다양한 자료들도 전시된다.
장대한 구도와 표피적 묘사, 물성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그려진 금강산은 오랜 세월 한민족의 상징으로 자리해왔다. 일제강점기 안중식, 이응노, 변관식, 이상범 등은 식민지 시기의 혼란 속에서도 전통의 힘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금강산 그림에 매진했고, 전통미학과 시대정신이 담긴 금강산 산수화를 꾸준히 제작했다. 이번 대백프라자갤러리 특별기획전 《금강산에 그리움을 담다》는 시각예술의 관점에서 금강산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조명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